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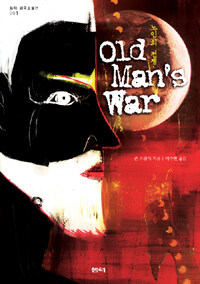
주위에서 노인 부대에 입대했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부고 없이 갑자기 사라진 노인 중 몇몇은 인류를 지키러 우주로 나갔을지도 모른다. 기력이 쇠하고 뼈마디가 쑤시고 기억이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나를 살려내라는 의미의 역설적 표현인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때 누군가가 내게 젊음을 되찾게 해주겠다며 그 대신 군대에서 최대 10년간 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물론 지구의 모든 것과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 지금도 70억 명이 부대끼며 지구의 자원을 축내고 있는데, 가뜩이나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제2의 삶까지 부여하면 금세 지구가 초만원이 될 테니 말이다.
32년 뒤에 내가 이런 제안을 받으면 덜컥 받아들일까? 자식들은 결혼해서 (어쩌면) 자기들도 아버지가 되어 있을 테고, 아내와는 이혼했거나 사별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내가 서른두 해를 더 산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과의 끈은 점차 적어진다. 얼마 남지 않은 끈은 더 소중해질까? 목숨에 대한 집착은 커질까, 작아질까? 삶에 대한 미련과 살아 있음에 대한 미련은 같은 걸까? 나는 살면서 끔찍한 잘못을 여럿 저질렀으며 바꾸고 싶은 조건도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 삶과 단절하는 조건으로 제2의 삶이 주어진다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다.
몇 년 전의 나였다면 심각하게 고민했을지도 모르겠다. 통증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게 두려웠고 죽음은 통증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때의 나에게 새로운 삶이란 새로운 몸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물다섯 살의 내 육체가 이상적이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스포일러가 될까봐 조심스럽지만, 노인 병사가 받는 새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꽤, 아니 매우 좋은 몸이다. 전사의 몸(실은 인간 병기).
하지만 이 몸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으니, 그것은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섹스는 할 수 있지만 아기를 만들거나 가질 수는 없다. 노인을 모병 대상으로 삼은 데는 이런 까닭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지상 목표다. 인디언 전사 중에서 죽음을 맹세한 자들은 원하는 여자와 잘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고 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용맹한 전사의 유전자가 후대로 전달되지 않아 결국 겁쟁이만 득시글할 테니까.
랑구르원숭이는 생식 연령이 지나면 집단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성기 암컷은 이기적이어서 늙은 암컷의 먹이를 빼앗고 그늘을 차지하지만, 늙은 암컷은 자신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한다. 새로운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이미 낳은 자식, 또는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척을 돕는 것이 그나마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구에 자식이 있고 더는 자식을 가질 가망이 없는 노인 병사는 인류를 위해 이타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책에서 가정하는 몸의 교체는 올 2월에 이탈리아의 신경외과의사 세르지오 카나베로가 제안한 전신 이식과 꽤 비슷하다. 단, 책에서는 물리적 머리가 아니라 정신(의식)만이 보존된다. 그렇다면 이식 전과 이식 후에 유지되는 나는 무엇일까? 물론 이 정신은 영혼이 아니라 두뇌 활동이다. 나의 정신은 유전자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아직 신경세포가 제대로 연결되기 전의 유아는 ‘나’가 아닌 걸까? 인격체가 아니라고 보아도 될까?
노인을 모병해야 하는 이유는 인류가 외계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계지성체탐사프로젝트(SETI)에서 보듯 인류는 외계인과 만나기를 고대하지만, 첫 만남은 화기애애한 교류가 아니라 한 쪽의 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3의 침팬지』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안에서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만났을 때 거의 예외 없이 한쪽이 다른 쪽을 절멸시켰다면서 인류와 외계인이 만났을 때에도 더 발전한 쪽이 상대방을 절멸시킬 것이라 예견한다. 그러면서 가까운 곳에 외계인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만일 우리보다 앞선 문명의 외계인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현대인을 만난 원시 부족 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인류는 어느 외계 종족과도 손잡지 않고 오로지 정복만을 추구한다. 물론 식민지 행성 개척은 제국주의에 빗댄 것이지만, 실제로도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만 같다. 원죄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처음의 죄가 아니라 본질적 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죄, 바로 인간의 존재 조건일 것이다.
노인 병사의 목숨은 덤이다. 입대 서명 후 72시간이 지나면 그는 지구에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병사의 목숨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가 중상을 입었을 때, 치료하여 살리는 것과 새 병사를 만드는 것 사이에서 비용을 저울질하지는 않을까? 목숨값이 무한한 사람과 유한한 사람이 한 장소에 공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인은 이 문서에 최종 서명한 후 72시간이 지나거나, 우주개척방위군에서 보낸 지구발 이송수단을 타거나, 둘 중 빠른 시점에 맞추어 관련된 모든 정치체, 이 경우에는 오하이오 주와 미합중국에서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남은 모든 재산은 법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법적 사망으로 종료되는 모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완전히 끝납니다. 이롭거나 해로운 이전의 모든 법적 기록이 무효화하며, 모든 부채는 법에 따라 소멸합니다.”
주인공 존 페리는 아내가 죽은 뒤 75세 생일에 모병사무소에서 우주개척방위군(CDF)에 입대 서명을 한다. 우주개척방위군은 우주개척연맹(CU) 산하의 군대로, 지구인을 위해 행성을 개척하고 개척 행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75세 노인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것은 CDF가 젊음을 되찾아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의 조건이다. 서명하고 나서 72시간이 지나면 나는 지구인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되며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내가 페리라면 그 사흘 동안 무슨 짓을 했을까? 소설에는 페리가 모병사무소를 나서 나이로비에서 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구를 벗어나기까지의 72시간이 누락되어 있다. 그것은 그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내게 보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다. 상대방을 이후에 결코 만날 일이 없을 때, 이를테면 상대방이 죽을 것이 틀림없거나 내가 죽을 것이 틀림없을 때 우리는 인간성의 허울을 벗어버린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에게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독일군은 상대방이 죽을 것임을 알았고, 한국인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본군은 자신이 전사할 것임을 예감했을지도 모른다.)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과 해코지한 사람을 언젠가 다시 만나 보은/보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흘 동안 신나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데이튼 공항까지 가는 버스를 놓쳐 지구에 남게 되면 꽤 곤란해질지도 모른다. 나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기에, 내게 어떤 보복을 해도 기껏해야 ‘사체훼손죄’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남에게도 똑같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달갑지 않다.
사흘 뒤, 존 페리는 우주개척방위군 병사가 된다. 그 이후는 잘 짜인 전쟁 이야기다.
출처: 《악스트》 2015년 7~8월 호 63쪽